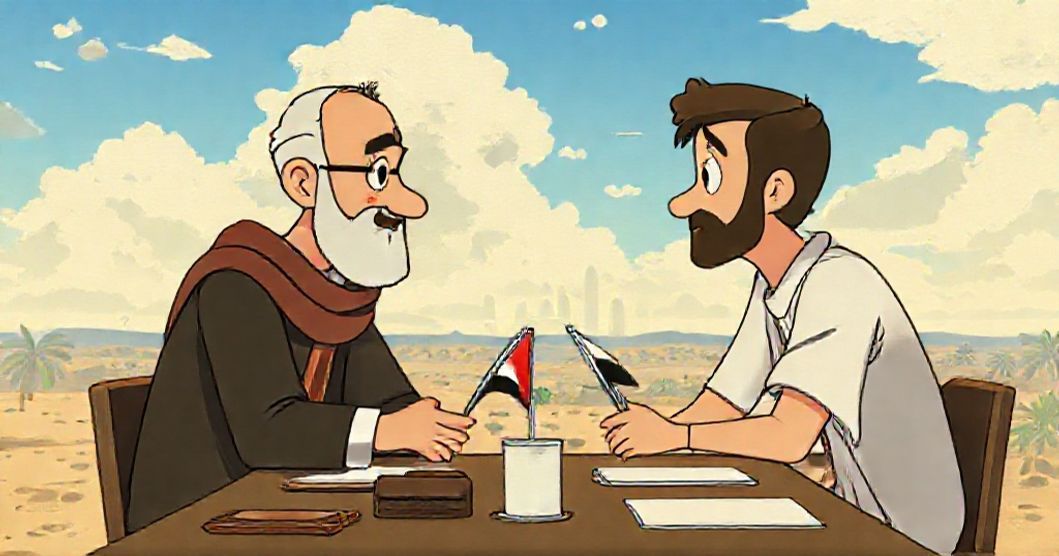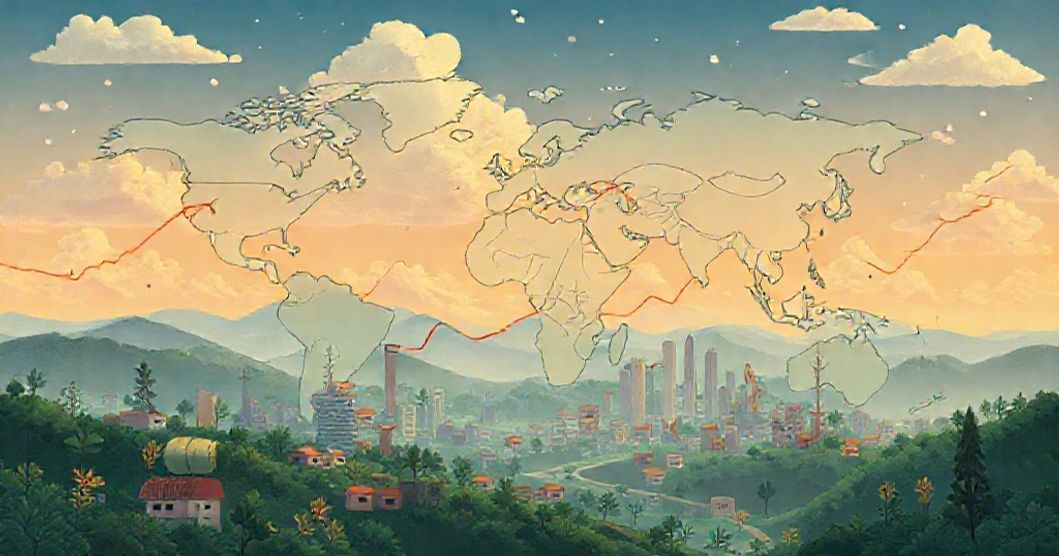기획재정부가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내년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하며 2029년에는 1362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4년간 약 330조원 이상 증가함을 의미하며, 한국 경제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경 기준 926조5000억원으로 집계되며, 이는 지난해보다 111조3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적자성 채무란 대응 자산 없이 발행되는 부채로, 일반회계 적자 충당을 위한 국채 발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러한 채무는 미래 세대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실질적인 국가 부채로 간주된다.
매년 100조원씩 증가하는 국가 부채
정부 계획에 따르면 적자성 채무는 2026년 1029조5000억원으로 처음 1000조원을 넘어선 후, 2027년 1133조원, 2028년 1248조1000억원, 2029년 1362조5000억원으로 매년 100조원 이상씩 급속도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는 연평균 110조원씩 증가하는 수준으로, 한국 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진다는 것이다. 2025년 72.7%였던 적자성 채무 비중은 2029년 76.2%로 상승해, 국가 부채의 구조적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는 정부의 재정 운용이 점점 더 미래 세대의 세금에 의존하게 됨을 의미한다.
잠재 채무까지 고려하면 2000조원 시대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담하지는 않지만 잠재적 위험 요소인 잠재 채무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보증채무는 올해 16조7000억원에서 2029년 80조5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64조원 증가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부채와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한 잠재 채무는 2029년 10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적자성 채무와 합치면 정부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총 재정 부담이 200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는 한국 GDP의 약 70%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